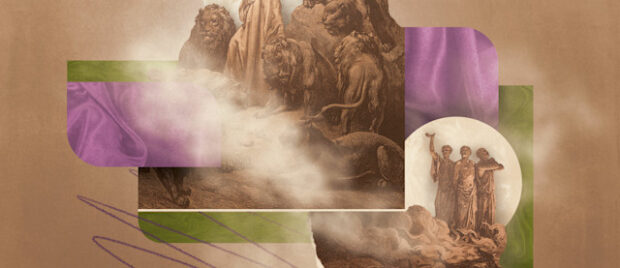성령님에 대한 다섯 가지 진리
2023년 04월 27일
TULIP(튤립)은 무엇인가
2023년 05월 04일개혁신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맥락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데 있어 문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고 있다. 성경은 수천 년 전에 지금과는 매우 다른 문화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언어로 기록되었다. 단순히 주어진 것들, 곧, 원저자와 그들의 독자들을 위한 일상적인 현실은 우리가 연구하고 배워야 할 것들이다. 구약성경을 공부하려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배워야 한다.(또는 이런 언어를 배운 번역자를 의지해야 한다). 성경 저자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 고대 근동의 역사, 지리, 문화 및 관행에 대해서도 배워야 한다. 신약성경을 공부한다면 헬라어를 배워야 하고 로마 제국이 지배한 1세기 세계에 대해 배워야 한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문법-역사적 해석(grammatical-historical interpretation)의 기본이 되는 부분이다.
개혁신학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맥락도 중요하다. 개혁신학은 16세기 개신교 종교개혁의 열매였으며 종교개혁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맥락에서 일어났다. 그 당시 글을 쓰는 저술가들은 특정한 철학적, 신학적 맥락에서 글을 썼다. 이러한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것은 개혁주의 신학을 이해함에 있어 중요하다. 나는 여기에서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인 세 가지 맥락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역사적 맥락(Historical Context)
개신교 종교개혁은 한 무리의 로마 가톨릭 수도사들이 어느 날 오후 갑자기 지루해져서 감당할 수 없는 파티를 열기로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수 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의 절정이었다. 교회와 다양한 정치 단체(많은 지역 단체뿐만 아니라 제국의 단체)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정치 단체 자체 안에서의 다양한 갈등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부정부패와 수많은 개혁 시도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갈등도 있었고, 경제적 변화와 기술 변화를 포함한 문화적 변화도 한몫했다.
예를 들어 초기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신교 저술인 마르틴 루터의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고함(To the Christian Nobility of the German Nation)』 또는 『교회의 바빌론 유수(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를 읽을 때 우리는 역사적 맥락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볼 수 있다. 존 칼빈(John Calvin)의 기독교강요(Institutes) 시작 부분에 있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보내는 서문(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I of France)”을 읽을 때도 이런 관련성을 알 수 있다. 이 서문은 기독교 강요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맥락이 된다.
또한 많은 개혁파 신앙고백서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을 가정하거나 이에 대응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역사적 맥락이 개혁신학의 내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된 가장 분명한 예는, 국가 위정자나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관한 주제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원본과 미국 개정판 사이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개혁신학을 이해하는 데 역사적 맥락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신자가 개혁주의 신학을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그는 시간을 내어 14세기와 15세기, 즉 종교개혁 직전 200년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그런 후에 16세기와 17세기의 역사를 연구해야 한다. 신학은 역사적 공백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철학적 맥락(Philosophical Context)
개혁신학의 철학적 맥락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적 시기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개신교 종교개혁은 16세기 초 마르틴 루터의 저서로 시작되었다. 존 칼빈의 기독교강요(Institutes)의 첫 번째 라틴어판은 1536년에 출판되었고 최종 라틴어판은 1559년에 출판되었다. 츠빙글리(Zwingli), 무르쿨루스(Musculus), 버미글리(Vermigli), 블링거(Bullinger), 베자(Beza), 짱키우스(Zanchius), 우르시누스(Z.Ursinus), 짱키우스(J.Zanchius)와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요 저서들도 16세기에 출판되었다. 초기 정교회 시대(Early Orthodoxy)의 개혁주의 스콜라 신학자들의 모든 저작물과 고등 정교회(High Orthodoxy) 시대에 출판된 대부분의 저작물은 17세기 말 이전에 출판되었다. 이것은 폴라누스(Polanus), 에임스(Ames), 볼레비우스(Wollebius), 마코비우스(Maccovius), 비치우스(Witsius), 튜레틴(Turretin), 마스트리히트(Mastricht)와 같은 개혁 신학자들의 작품이 포함된다.
우리의 철학적 전제는 현실과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모든 주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와 교리 문답도 이 두 세기 동안 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테트라폴리탄 신앙고백서(Tetrapolitan Confession)(1530),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1536), 프랑스 신앙고백서(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1560), 벨직 신앙고백서(1561),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1563),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1566), 도르트 신조(1618-19),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1647),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서(1647)는 16세기와 17세기 전반에 저술되었다.
이런 사실은, 고전적 개혁파 신학자들의 위대한 신학 저서들과 그들이 저술했던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모두 계몽주의 이전 철학적 맥락의 마지막 시대에 출판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신학자들은 계몽주의의 “주체로의 전환(turn to the subject)” 전에 글을 쓰고 있었다. 소위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르네 데카르트(Rene Descartes)가 16세기 말인 1596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또한 이런 저서의 영향력이 대학과 신학자들 사이에서 느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이것은 계몽주의 이전의 철학적 맥락이 획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현대 철학으로 이어질 때 철학적 선구자가 존재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르네상스 시대에 재발견된 것이 고대 그리스의 회의주의뿐만 아니라 유명론(nominalism) 철학에도 있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고전적 개혁주의 신학의 철학적 전제가, 데카르트 이후 시대의 어떤 것보다 중세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철학적 전제와 훨씬 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인간의 마음과는 관계없는 외부 세계의 존재 또는 하나님이 주신 감각과 합리적인 능력을 사용하여 그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맥락에서 작업했다. 게다가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예를 들어 유명론) 사물이 실제 본성을 갖는다고 인정하는 철학적 맥락 내에서 작업했다.
개혁신학의 이런 일반적인 철학적 맥락은 계몽주의적 견해가 스며들고 신학자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점차 사라졌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학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다. 리처드 뮬러(Richard Muller)는 (계몽주의 이전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Christian Aristotelianism)”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렇다면 개신교 정통주의(Protestant orthodoxy)의 쇠퇴는 스콜라적 방법론과 기독교 아리스토텔레스주의라는 상호 관련된 지적 현상의 쇠퇴와 일치한다. 합리주의 철학은 궁극적으로 적절한 하녀(ancilla)가 될 수 없었다. 대신 합리주의 철학은, 신학이 아니라 합리주의 철학이 학문의 여왕이 되길 요구했다. 교리를 보완하고 스콜라적 방법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철학적 구조가 없었기 때문에 개신교 정통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다시 말해, 16세기와 17세기에 개혁주의 신학의 거물들이 그토록 많았는데,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적어진 이유는 대부분 후기 신학자들이 다양한 형태의 계몽주의 철학을 채택하고 계몽주의 이전의 철학적 맥락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 개혁신학이 계몽주의 철학적 전제에 적응될 때 개혁주의 신학은 시들고 죽어간다.
우리의 철학적 전제는 실체와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친다. 심지어 오늘날 대부분의 개혁신학 독자들은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한 채 계몽주의 이후의 철학적 원리를 흡수하면서 성장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며 마시는 공기와 같기 때문이다. 계몽주의 이후의 렌즈를 통해 이런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리를 읽는다면 이것은 쉽게 전통적인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오해로 이어진다. 더 심각하게, 많은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는 의식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계몽주의 이후 철학의 한 버전 또는 다른 버전을 채택했다. 후기 계몽주의 철학은 하나님, 인간, 죄,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어떤 형태의 계몽주의 이후 철학을 채택한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가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 동의할 때, 모든 개혁파 신앙고백서는 계몽주의 이전의 철학적 맥락에서 사유했던 신학자들이 저술했으므로 필연적으로 내부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신앙고백서의 가르침을 근본적으로 수정하거나 거부하려는 유혹은 항상 존재할 것이다. 신앙 고백적 개혁주의 교리에 대한 이러한 급진적인 수정과 거부는 이미 일어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것을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교리를 거부하는 현대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글에서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CF) 2장).
신학적 맥락(Theological Context)
누군가 도르트 신조의 신학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일반적으로 아르미니우스 논쟁(the Arminian controversy)과 항론파(the Remonstrants)의 신학을 어느 정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도르트 신조는 항론파/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특정한 교리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개혁신학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개혁신학은 이미 존재했던 중세 후기 로마 가톨릭 신학에 반응하여 개혁한 것이다.
이런 신학적 맥락은 초기 개혁파 신학자들의 저서와 우리의 개혁파 신앙고백서 전체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개혁파 신학자들과 개혁파 신앙고백서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관행에 계속해서 대응하는 것을 본다. 때때로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관행을 바로잡기도 하고, 때로는 로마 가톨릭 교리와 관행을 완전히 거부하기도 한다. 우리가 그런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관행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개혁파 신학자들과 신앙고백서가 다루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16세기와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은 중세 후기 가톨릭 신학을 이해했다. 또한 그들의 독자 대부분(다른 신학자와 목회자)도 중세 후기 가톨릭 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많은 현대 개혁신학의 독자는, 기본적인 로마 가톨릭 교리와 관행에 관해 초기 개혁파 신학자들과 그들의 독자들이 가졌던 것과 동일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로마 가톨릭 신학의 포괄적인 교회-성직자-구원론 체계(ecclesio-sacerdotal-soteriological system)에 대해서도 같은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 그들은 칭의 또는 성경과 전통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에 관해 부분 부분 단편적으로 들었을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전체 로마 가톨릭 신학 체계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특성과 각 부분이, 다른 모든 부분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것은 개혁신학의 현대 독자들을 도르트 신조의 독자의 입장과 같은 입장에 놓이게 한다. 도르트 신조의 독자는, 도르트 신조가 대응하고 있는 아르미니우스 신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런 지식 없이도 개혁신학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신학적 맥락이 없다면 그런 제한된 이해는 잘못된 이해로 빠지기 쉽다. 예를 들어, 아담의 타락 이전의 상태와 그 당시의 자연과 은혜의 관계에 관한 로마 가톨릭의 이해가, 죄와 은혜와 칭의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이해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는 개혁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지식은 죄, 은혜, 칭의에 관한 개혁신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맥락이다.
결론
고전적 개혁신학은 아무 맥락 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철학적, 신학적 맥락과 함께 실제 인류 역사 속에서 전개되었다. 우리는 그런 맥락에서 500년이나 떨어져 있다. 21세기의 역사적, 철학적, 신학적 맥락은 16세기와 17세기의 맥락과는 매우 다르다.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아주 쉽게 우리가 사는 현대의 맥락으로 16세기와 17세기의 저작물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16세기와 17세기의 맥락에 대해 모르는 채로 있다면,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 쉽다. 요컨대, 우리가 성경 저작들의 맥락을 배우는 데 들이는 것과 같은 동일한 종류의 노력을 고전 개혁신학의 맥락을 배우는 데 기울여야 한다.